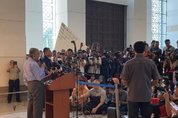
말레이시아 정계의 '거인' 마하티르가 지난달 26일 퇴진했다. 이 때만해도 안와르에게 성공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문제가 초점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드라마 같은 반전이 일어났다. 국왕은 29일 마하티르도 아니고 안와르도 아닌 무히딘 야신(72)을 신임 총리을 임명했다. 마하티르 재신임을 위한 '신의 한수'인 사임 카드가 거센 역풍에 직면했고, 되레 그를 권력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촉매제가 되었다. 마하티르도 큰 충격을 받았다. 말레이시아 정국에 대해 관전자들마저 딱 부러지게 전망하기 어렵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정상적인 야신의 임명절차를 미뤄지고 있다. 아세안익스프레스가 어떤 역사 대하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말레이시아의 2020 정치위기 들여다보기'를 시리즈로 준비해보았다. <편집자주> 1. 싱가포르가 말레이연방에서 빠진 이유는? 싱가포르가 한때 말레이 연방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동남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오늘날 싱가포르의 국부로 추앙받는 리콴유는 1965년 싱가포르 독립 이전에는 말레이연방의 총리를 꿈꾸기도 했을 정도였다. 싱가포르가 말레이 연방에서 분리된 원인은 바로 이 복잡한 민족갈등 때문이다. 전체민족

말레이시아 정계의 '거인 '인 마하티르가 지난달 26일 퇴진했다. 이 때만해도 안와르에게 성공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문제가 초점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드라마 같은 반전이 일어났다. 국왕은 29일 마하티르도 아니고 안와르도 아닌 무히딘 야신(72)을 신임 총리을 임명했다. 마하티르 재신임을 위한 '신의 한수'인 사임 카드가 거센 역풍에 직면했고, 되레 그를 권력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촉매제가 되었다. 마하티르도 큰 충격을 받았다. 말레이시아 정국에 대해 관전자들마저 딱 부러지게 전망하기 어렵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정상적인 야신의 임명절차를 미뤄지고 있다. 아세안익스프레스가 어떤 역사 대하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말레이시아의 2020 정치위기 들여다보기'를 시리즈로 준비해보았다. <편집자주> 1. 말레이시아의 양심...30년 전 약속된 '차기지도자' 1947년생인 안와르 이브라힘(73). 현재 포트딕슨 국회의원이자 말레이시아 인민정의당(PKR) 당수이며 지난 2월 말까지 연립내각 희망연대(파카탄 하라판·PH)의 리더 역할을 맡은 인물이다. 2018년 5월의 선거승리는 정치범으로 감옥에 맞아야 했으며, 승리한 직후에 열린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

2019년 11월 25~26일간 있었던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의 대외 관계에서 보면 화룡점정(畵龍點睛)이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의 각국 정상들이 모여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신남방정책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과 협력을 논의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동남아 10개국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인 아세안과 대외관계로 연결된 국가 및 협력 플랫폼을 조명해보자고 한다. ■ 아세안의 대외 관계...무역-투자 증진, 사회문화, 지역 안보 확대 1970년대 확대 외교장관회의(Post-Ministerial Conferences)을 계기로 아세안 외교장관들과 외부 당사자들이 만남으로써 아세안의 대외관계 확장이 시작되었다. 아세안의 대외 관계는 아세안의 기술 및 경제 지원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대화 상대국과의 무역 및 투자 증진, 사회문화, 지역 안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아세안은 완전 대화 상대국(Full Dialogue Partner), 부분 대화 상대국(Sectoral Dialogue Partnership), 비국가 대화 파트너(Non-Country Dialogue Partner),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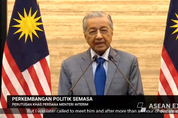
말레이시아 정계의 '태풍의 핵' 마하티르가 지난달 26일 퇴진했다. 이 때만해도 안와르에게 성공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문제가 초점이었다. 하지만 94세 노정객 마하티르는 욕심을 거두지 않았다. 퇴진은 안와르 이양을 거부하고 다시 집권을 위한 '꼼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여기서 드라마 같은 반전이 일어났다. 국왕은 29일 마하티르도 아니고 안와르도 아닌 무히딘 야신(72)을 신임 총리을 임명했다. 마하티르 재신임을 위한 '신의 한수'인 사임 카드가 거센 역풍에 직면했고, 되레 그를 권력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촉매제가 되었다. 마하티르도 큰 충격을 받았다. 말레이시아 정국에 대해 관전자들마저 딱 부러지게 전망하기 어렵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정상적인 야신의 임명절차를 미뤄지고 있다. 아세안익스프레스가 어떤 역사 대하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말레이시아의 2020 정치위기 들여다보기'를 시리즈로 준비해보았다. <편집자주> 1. 외국인이 이해하기 힘든 말레이 정치 만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쯤 동남아시아의 이목은 마땅히 말레이시아의 복잡한 정국과 마하티르의 퇴진에 초점이 모아졌을 것이다. 그만큼 중요한 사

지난 번 이야기에서 짚은, 조선의 원혼이 일본에 건너가 “원령문화로 꽃 피웠다”는 서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중심에는 원령이 문학-예술의 모티브로 들어서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원령을 모티브로 삼은 예능으로서 일본의 전통연극 노-(能)를 살펴보기로 하자. 무릇 노-란 무엇인가? 노-는 일본의 전통예능의 하나로 쿄-겐(狂言:, 가부키 연극)과 함께 남북조 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실연되는 세계에서도 가장 오랜 연극생명과 전통을 가지고 있다. 독자의 양식을 갖는 노-무대에, 노-가면을 쓰며, 제아미(世阿弥)가 ‘가무이도(歌舞二道)’라고 지적하듯이 춤으로 높여지고, 추상화한 연기와 노래[謠(우타이)]와 반주음[囃子(하야시)]에 의한 음악 요소의 융합된 연극이다. 메이지 이후 ‘노가쿠(能樂)’라고 부르는 편이 일반화되었지만 ‘사루가쿠(猿樂)’ 또는 ‘사루가쿠노 노-’로 불러지며 제아미는 사루가쿠(申樂)이라는 글자로 이에 등치시키고 있다. ‘노-(能)’란 가무를 딸리고 연극적 전개를 갖는 예능의 의미이며 덴가쿠(田樂)의 노-, 엔넨(延年)의 노도 행해지고 있는데, 사루가쿠의 노-와 같은 발달을 이룩하지 못했다. ‘요쿄쿠(謠曲)’는 노-

전세계 주식시장이 신종바이러스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시장이 하나 있다. 바로 미얀마의 주식시장인 '양곤 스톡 익스체인지' 줄임말로 'YSX'가 그 주인공이다. 동남아시아 금융시장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미얀마의 주식시장의 존재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2016년에 본격적인 문을 연,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늦게 태동한 현대적 증권거래소이자 가장 작은 규모의 시장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상장된 기업의 숫자는 5개에 불과하고 전체 시총도 5000억원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작다 (인접국 태국의 상장회사는 600여 개에 이른다). 이런 소규모의 미얀마 증권거래소(YSX)가 최근 국제적 관심을 끄는 이유는 오는 3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의 거래 참여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일정 정도의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미얀마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어야 하고, 외국인 지분은 기업전체 지분의 35%를 넘어설 수가 없도록 정해졌다. 이 외국인 지분에 대한 내용은 개별 회사가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앞으로 거래를 원하는 외국인은 양곤시내 증권거래소에 가서 계좌

아세안 지역으로 우리 금융회사들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정부는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왜 금융협력센터를 설립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금융의 본원적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금융의 영어 단어 ‘Finance’의 어원을 살펴보자. 앞부분의 ‘Fin’은 원래 로마시대의 국경을 의미하는 ‘finis’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국경에는 땅끝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Fin’의 의미도 자연스럽게 ‘종료, 완성, 목표’를 뜻하게 되었다. 따라서, 금융이란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뭔가 원하는 것을 실현시키고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가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은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방향을 선도하는 설계 내지 스케치가 될 것이고, 다양한 협력 노력들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윤활유와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역할에 충실하려면, 현장에서 발로 뛰고있는 한국 기업들과 동포들에게 우리의 현지 금융지원 시스템이 든든한 우군이자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개편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의 상황, 도전요인, 앞으

일본에는 ‘고료-신코-’(御靈信仰, 이하 ‘어령신앙’)라는 신앙이 있다. 이 신앙은 비명에 죽은 사람의 영혼=어령이 무서운 지벌을 내린다고 두려워해 그 영혼을 달래야 한다는 믿음이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원령신앙’인데, 이 신앙이 생겨난 것은 기록으로는 8세기 말 시작된 헤이안(平安) 기 이후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한토(한국의 땅)에서 무교가 일본에 건너간 것이 야요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 만큼 그때 무교에 내재한 원혼신앙도 당연히 건너갔을 것이다. 글쓴이의 생각으로는 원혼(冤魂)신앙이 ‘원령(怨靈)’이란 옷을 입고 왜 땅에서 태어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고대인들은 원혼이 천재나 역병 같은 재앙을 가져온다고 믿었다. 원혼이란 한을 품고 죽었다든지 비명에 죽은 사람의 혼령을 말한다. 그런데 왜 땅으로 건너간 원혼 신앙은 그 본고장인 조선과는 달리 ‘원령문화’로 꽃피웠다. 조선에서는 경직된 유교 이데올로기에 속박되고 핍박을 받는 신세로 전락돼 무교의 원혼신앙은 ‘무속(巫俗)’이라는 이름으로 사교(邪敎) 화 된 것과 대비된다. 일본의 민속학자로 이름난 야나기타 쿠니오(柳田国男)는 신(神)이 되는 인간의 자격 조건을 두 가지 들고 있다. 하나는 높은 지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