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가 이제까지 일본어 서사를 몇 회에 걸쳐 썼지만 한 나라의 언어를 단지 몇 차례로 그 전체 상을 그린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 여느 어부가 조각배로 한 나라 언어의 거대한 대양을 건너가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글쓴이는 그것을 알지만 ‘고래사냥’이 아니라 잔챙이라도 건져 올리려는 심정에서 쓴 것이다. 그 잔챙이란 일본어가 지닌 한국어와의 근친성 또는 차별성, 발음의 특이성, 한자훈독의 난해성, 인명과 지명의 다기성, 차별어의 병리성을 더듬어 본 것이다.
그밖에 일본어는 상대방을 받드는 존경어, 자신을 낮추는 겸양어가 특히 발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한국어 ‘가다’는 일본어로 ‘이쿠(行く)’지만 겸양어 ‘마이루(参る)’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존경어 ‘이럇샤루’도 있다. 이와 함께 ‘가시다’ ‘오시다’ ‘나가시다’ 등 두루 표현하는 존경어도 있다. 한국어에도 ‘가 나이다’와 같은 예스러운 겸양어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존경어로 ‘납시다’와 같은 예스러운 말과 함께 ‘가시다’라는 말은 있다.
이번 이야기로 일본어 서사를 갈무리해 보자. 이전 이야기서 글쓴이는 한국어와의 근친성에서 볼 때 한국어와 일본어는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일란성 샴 쌍둥이와 같다고 비유한 적이 있다. 핫토리 시로-(服部四郞)이라는 일본의 언어학자는 “일본어는 조선어에 제일 가깝다고 생각된다”면서 “이것은 4000년 전쯤에 갈라졌고 일본어와 아이누어는 7000년 전쯤에 갈라졌지 않았을까”헤아린다(江上波夫외, 1980, 124).
도읍=健牟羅=큰 무라
중국의 사서 <양서(梁書)> 「신라전」을 보면 “신라에서는 도읍(都邑[미야코])을 健牟羅라 칭한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健牟羅를 한국어를 읽으면 큰 무라가 되는데, 이는 큰 마을 즉 도읍이다. 이것은 신라어 ‘무라’가 일본으로 건너가 그대로 무라(村), 즉 마을이 된 예일 것이다. 마을이 커지면 ‘고을’이 되는데 일본인은 이를 郡이라고 쓰고 ‘코우리’라고 읽는다. 일본 동북 지방에 있는 郡山을 ‘코우리야마’라고 읽는데, 이것은 한국어 ‘고을’에서 나온 말에 틀림없다. 한일비교언어학에 밝은 김용운 교수는 이들 말을 견주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韓国人と日本人, 金容雲, 1983, 149).

한국어 일본어
(1)ウル[울] 囲い·領域
(2)マウル[마울, 신라어로 牟羅(무라)] 村
(3)コウル[고울] 郡
(4)ソウル=健牟羅[신라] 都
(5)ナラナ=ナウル[신라어] 国
(6)ハンウル 天
또한 일본인의 한문 훈독의 난해함을 다시 한 번 짚어 보면 예컨대 雨라는 한자의 경우 한국인은 ‘우’라고만 읽지만 일본인은 ‘아메’, ‘사메’, ‘다레’, ‘구레’라고 가지가지로 읽고 있다. <고지엔> 사전에 의하면 오오아메(大雨=큰 비)의 ‘아메’, 코사메(小雨=가랑비)의 ‘사메’, 시구레(時雨=가을비)의 ‘구레’, 사미다레(五月雨=5월 비)의 ‘다레’가 보인다.
또 다른 예로 重이라는 한자는 한국인에게는 ‘중’일뿐이지만 일본인은 ‘쵸-’ 또는 ‘쥬-’라고 읽는가 하면 가지가지의 훈독으로 읽는다. 부연하면 기쵸-(貴重), 손쵸-(尊重), 신쵸-(愼重)와 같이 ‘쵸-’라고도 쥬-로-도-(重労働), 쥬-긴조쿠(重金属)와 같이 ‘쥬-’라고도 읽는다. 훈독으로는 지방명 ‘미에(三重)’와 같이 ‘에’라고도, ‘카사네루(重ねる=겹치다)’라고도 읽으니 그 복잡난해 함이란 더할 나위가 없다.
미국은 흔히 ‘용융(鎔融) 가마(melting pot)’의 나라라고 한다. 서구 유럽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들이 구성한 나라이지만 그들은 이탈리아인, 독일인, 앵글로 색슨 영국인이 아니라 이탈이아 계 미국인, 독일 계 미국인, 앵글로 색슨 계 미국인으로 탈바꿈한 지 오래다. 옛날 노예 선을 탔던 아프리카인은 이제 어엿한 ‘아프리카 계 미국인(African-American)’이다. 근년에 이민한 한국인은 ‘한국 계 미국인(Korean-American).’
그런 맥락에서 일본사회도 용융 가마에 견주어 볼 수 있지 않을까. 8세기 들어 한반도의 통일신라에 대응해 일본에서도 그때까지 정립해 있었던 고구려 계, 백제 계, 신라 계 세력들은 ‘일본인’으로 외피를 갈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의 이름난 역사 소설가이자 문명비평가 사카구치 안고(坂口安吾)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이] 역사의 표면에 나타났을 때 모충(毛虫)이 나비[蝶]로 되듯이 전혀 다른 것으로 되었다. 그것이 미나모토(源) 씨이며 헤이케(平家=타이라 가문의 일족)이며, 오슈(岡州)의 후지와라(藤原) 씨이며...그들이 나비가 된 것이 일본인이 된 것이다”(金達寿, 1985, 180).
말의 용융 가마
그 파장이랄까 용융 가마는 말로 전파된다. 현재 일본 사회는 외래 말을 일제로 만드는 용융의 가마이다. 이른바 ‘와세이’ 한어(和製漢語), 즉 일본인이 만든 일제(日製)한어 라는 것이 있다. ‘인젠(院宣)’이란 천황의 자리를 물려준 상황(上皇)이라든가 법황(法皇)이 내리는 칙령을 말한다. 또한 세이하이(成敗)란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한어이지만, 그러나 일제 한어로 세이하이는 무사가 자신의 집안에서 무례를 범한 사용인을 제 손으로 베어 죽이는 것을 말한다.
일제 한어는 메이지 이후 만들어진 것이 많은데, 야보(夜暮)는 들판의 석양이 아니라 세련되지 못한 촌스러움이며, 세이와(世話)는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오세이와니나리마시타”[신세를 졌습니다]라는 사용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세’라는 뜻이다. 멘도-(面倒)라는 말은 체면을 구긴다는 뜻이 아니라 번거로움 또는 귀찮은 일이라는 뜻이다. 도쿄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한 다카지마 토시오(高島俊男)는 다음과 같은 일제 한어의 리스트를 들고 있다(高島俊男, 2001, 108~109).
야보(夜暮)--들판의 석양이 아니라 세련되지 못한 촌스러움
세이와(世話)--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신세라는 뜻
신츄-(心中)--복수 사람의 자살행위
무챠(無茶)--다테라메, 즉 엉터리라는 뜻
도-신(同心)--동심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
가로-(家老)--집안의 어른이라는 뜻이 아니라 일국 일성(一城)의 재상
가라이(家來)--귀인을 가까이 모시는 시종
신묘-(神妙)--불가사의하다는 뜻과 함께 얌전하다는 의미
칸도-(勘当)--놀기를 좋아하는 아들을 쫓아내는 것
슈쿠덴(逐電)--나쁜 일을 하는 모습을 감추는 것
쇼다이(所帶)--가족, 가정을 말함
스이산(推参)--낯 두껍다는 뜻의 후안무치
무게(無下)--말도 안 된다는 뜻
후치(扶持)--급료라는 뜻
릿푸쿠(立服)--격노하는 모습
소마츠(粗末)--조야한 하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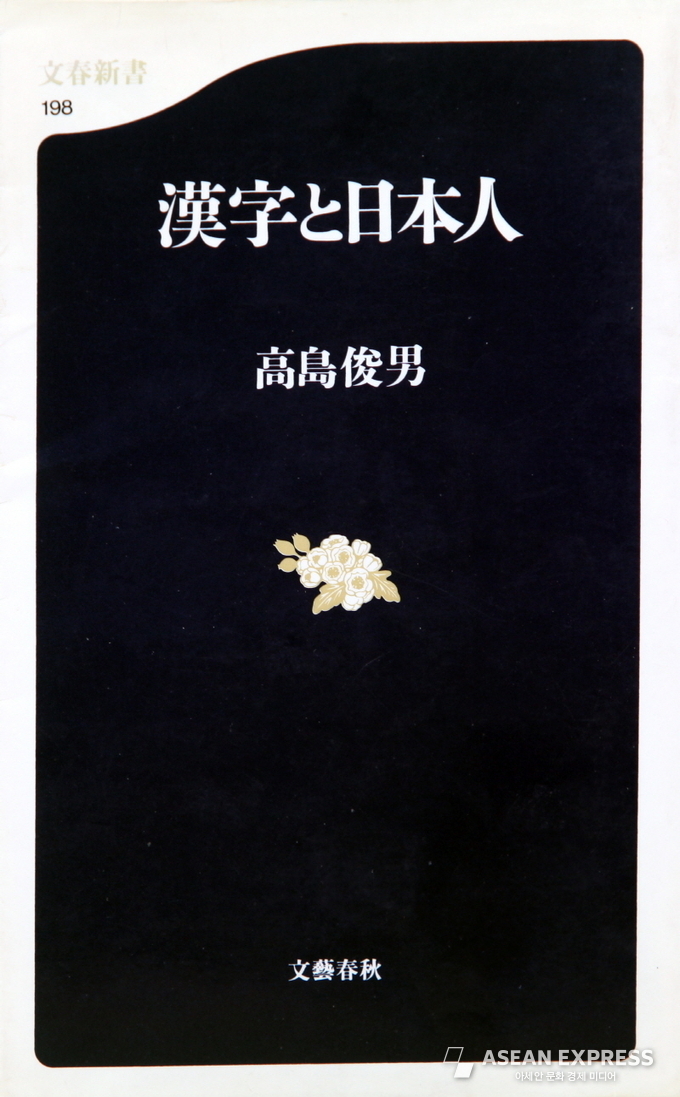
위에서 든 일제 한어는 대표적일 뿐 그 전체는 아니다. 그보다 훨씬 많기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한자의 본고장의 중국인이나, 한자 문화에 젖어 있는 한국인도 이를 알 수 없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말의 용융의 가마는 한자에만 한하지 않는다. 서구어도 일제 말로 탈바꿈하고 있다. 예컨대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세코하라’가 되는데, 최근 ‘하라’[괴롭힘]라는 일본식 영어는 더욱 진화하여 ‘파워하라’[이른바 ‘갑질’], ‘모랄하라’[moral hazard=도적적 해이]라고도 쓰인다. 문제는 이 외래어의 본고장 사람들이 이런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 이야기에서 ‘레크[レク]’라는 말을 이는 리크리에이션(recreation)의 약자인데 복지시설을 가리킨다고 했지만 일본인 밖의 사람들이 이 말을 언뜻 알아들을 수 있을지. 1950년대 이후 일본의 학생운동에서 파벌 간에 벌어진 테러 또는 린치를 의미하는 ‘우치게바(內ゲバ)’는 안[內] 이라는 일본어와 독일어 게발트[gebalt=폭력]의 조합어인데, 과연 독일어를 모국어로 삼는 게르만 족의 후예들이 이 말을 얼마나 알아들을까.
니시베(西部)라는 언론 평론가는 한때 ‘아카쟈(アカジャ)’라는 말을 써 글쓴이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적이 있다. 그 뜻을 글을 쓴 맥락에서 살펴보니, 그것은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합성어이었다. 즉 언론학자는 저널리즘 쪽으로, 저널리스트는 언론학 쪽으로 서로 지향해야 언론의 이상향에 이른다는 말이다. 말이야 좋지만 과연 이 합성어의 지나친 생략성을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이 든다.
글쓴이는 이 글의 모두에서 일본어가 상대를 받드는 존경어와 자신을 낮추는 겸양어가 발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그런 일본어가 왜 조선인과 부라쿠민(部落民을) 깔보는 차별어로 오명을 떨치고 있는지 불가사의한 일이다. 하지만 날뛰는 말에 괜한 행인이 차일 때 사나운 ‘말’을 다스리지 않은 마주가 과연 당당할 수 있을까.
글쓴이=김정기 한국외대 명예교수 jkkim63@hotmail.com
 김정기 교수는?
김정기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 미국 컬럼비아대학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일본 근대정치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언론학회 회장, 방송위원회 위원장,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부 명예교수.
저서로 『국회프락치사건의 재발견』(I·II), 『전후 일본정치와 매스미디어』, 『전환기의 방송정책』, 『미의 나라 조선:야나기, 아사카와 형제, 헨더슨의 도자 이야기』 등이 있다









